방언-겨레의 작은 역사/ 이길재 / 마리북스 / 2023
제주 BOOK카페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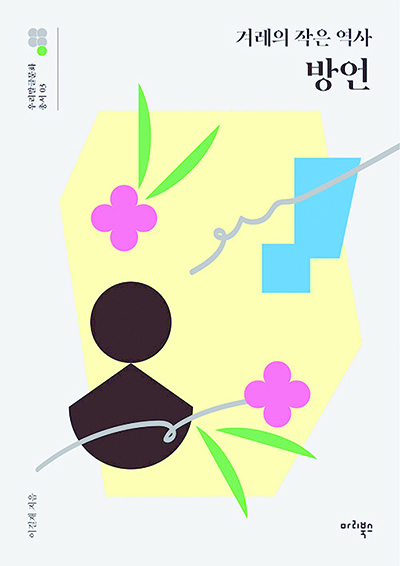
내가 제주도에서 초ㆍ중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제주 방언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무사?”, “~마씨“ 정도는 일상에서 썼지만, 특히 수업 시간에는 제줏말을 쓰면 아이들이 깔깔깔 웃었다. 사투리를 쓰면 규격화되지 못한 사람 취급 받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요즘은 제주어로 뉴스를 진행하는 TV 프로그램도 있고, 제주어 문학의 위상도 높아졌다.
혹자는 제주 방언을 제주어라 부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제줏말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어’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제주어라 부르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언제부터 굳어지기 시작한 것인지 궁금해서 제주어종합상담실(1811-0515)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제주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의 문헌에도 나타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은 1995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제주어사전』에서 ‘제주어’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2007년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어라는 명칭이 공식화됐다고 한다. 『제주어사전』은 2009년에 개정ㆍ증보판이 나왔고, 내년 2024년에는 4만개 이상의 어휘가 담긴 『제주어대사전』이 편찬될 예정이다. 이 책을 쓴 이길재는 표준어는 늘 우리를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들게 한다고 지적한다. 언어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다. “방언은 우리의 정서를 가장 적절하게 담아내는 그릇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지역문화를 가장 잘 읽어 낼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말에 밑줄을 긋는다.
‘개구리’의 방언들을 보면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골개비(제주), 개오라지(전남), 까구랭이(경북), 개고리(강원), 머가리(황해), 메구리(평안), 멕자귀(양강) 등. 지역이 달라지면서 언어가 바뀌는 재미가 있다.
곽충구가 편찬한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태학사, 2019)을 보면 방대한 양에 놀라게 된다. 중국 길림성 조선족자치주 한인교포(함북 이주민 또는 그 후손)들의 조선어 방언을 수집해 엮은 책인데, 2권에 페이지가 4,000쪽을 넘는다. 어쩌면 그것도 다 담지 못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어떻게 언어로 다 담을 수 있을까. 곶자왈에 가면 생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돌벵이가 지난 자리에는 머잖아 재열이 앉을 것이다. 밥주리가 날면 낭썹이 더욱 푸르게 물결을 치겠지. 곶자왈에 제주어가 가득하다. 제주도가 제주어로 맹글어졌다.

